김승룡 jnnews.co.kr@hanmail.net
 [전남인터넷신문]지구 온난화와 기후변화가 본격화되면서 농업 현장에도 큰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지난 20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이 체결한 ‘초여름배추 시범재배 협업 업무협약’은 그 변화에 대응하려는 시도 중 하나다. 이 협약에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신규 농산물 재배 적지 발굴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단순한 선택이 아닌 시급한 과제로 다가오고 있다.
[전남인터넷신문]지구 온난화와 기후변화가 본격화되면서 농업 현장에도 큰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지난 20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이 체결한 ‘초여름배추 시범재배 협업 업무협약’은 그 변화에 대응하려는 시도 중 하나다. 이 협약에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신규 농산물 재배 적지 발굴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단순한 선택이 아닌 시급한 과제로 다가오고 있다.
올해 우리나라의 봄 작물들은 기온의 변동성과 저온 현상으로 인해 생육이 지연되고 수확이 늦어지는 등 불안정한 생산 양상을 보였다. 농작물은 재배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는 생물로, 각각의 작물마다 적합한 작형이 있다. 하지만 기후가 급변하면서 노지 재배보다는 시설재배에 의존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이는 냉난방과 환경 제어를 위한 에너지 사용 증가로 이어져 다시 온난화의 원인이 되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
중국이나 일본, 대만과 같은 국가들은 남북 길이가 길거나 고산 지대가 넓어, 기후대나 표고 변화에 따라 작물재배지를 조정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다. 예를 들어, 대만은 해발 2,000m가 넘는 산이 400여 개 이상, 3,000m 이상인 산도 300개 가까이 있어, 고산지에서는 온대 작물 재배가 가능하다. 일본 또한 남북으로 긴 지리적 특성을 활용하여 딸기, 배추 등 다양한 작물을 지역별로 분업화하여 재배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국토가 작고 남북으로 짧은 데다 분단 상황으로 인해 작물재배지의 북상이나 고지대 이전이 쉽지 않다. 이런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다양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품종 개발이 시급하다. 그러나 현재 품종 개발은 대부분 종묘회사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대량 수요에 맞춘 상업적 품종에 집중하고 있다. 소량 생산이나 지역 특화 작물에 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국내 농업 시험 연구기관도 육종에 힘쓰고 있으나 인력과 예산 등 현실적인 제약이 많다. 따라서 각 지역의 농업기술원이나 농촌기술센터가 주도적으로 지역 기후와 식문화에 맞는 작물을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노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전남처럼 농업 비중이 크고, 농업기반 식문화가 뚜렷한 지역일수록 지역 고유의 품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것이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핵심 전략이 될 수 있다.
예컨대 나주 보광골에서 재배되던 ‘보광골 열무’는 예전부터 여름철 풋김치 재료로 각광받아 왔지만, 아직까지 이 품종에 대한 공식적인 특성 조사나 육종 연구는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 지역 주민들이 자가 채종하며 이어온 이 품종은 지역 맞춤형 품종 개발의 귀중한 자원이다. 이러한 자생적 품종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연구하여 육성한다면, 전남의 환경에 맞는 품종 개발은 더 이상 어려운 과제가 아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술과 예산도 중요하지만, 각 지역의 작물자원을 적극적으로 ‘알아보려는 시선’과 ‘가치 부여의 의지’다. 기후 위기 시대, 전남농업은 품종 개발이라는 뿌리 깊은 전략으로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다. 지구 온난화의 파고를 품종의 힘으로 넘어서야 할 때다.
- TA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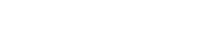


 굿네이버스 전북전주1지부-디저트붐, 좋은이웃가게 현판 전달식 진행
굿네이버스 전북전주1지부-디저트붐, 좋은이웃가게 현판 전달식 진행
 굿네이버스 전북전주2지부-전북청년경제인협회
굿네이버스 전북전주2지부-전북청년경제인협회
 굿네이버스 전북전주2지부-전북청년경제인협회, 돌봄공백 사업을 위한 후원금 전달식 진행
굿네이버스 전북전주2지부-전북청년경제인협회, 돌봄공백 사업을 위한 후원금 전달식 진행
 전주덕진아동보호전문기관 전주시 민간 어린이집연합회에 아동학대예방교육 진행
전주덕진아동보호전문기관 전주시 민간 어린이집연합회에 아동학대예방교육 진행
 전주완산아동보호전문기관- 국제로타리 3670지구 서전주⦁진안⦁전주제일 로타리클럽
전주완산아동보호전문기관- 국제로타리 3670지구 서전주⦁진안⦁전주제일 로타리클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