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룡 jnnews.co.kr@hanmail.net
 [전남인터넷신문]순채(蓴菜, Brasenia schreberi)는 '순나물', '순(蓴)', '수채(水菜)', '금대(金帶)'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다년생 수생식물이다. 수련과에 속하며, 잎 모양이 어리연꽃과 비슷해 혼동되기 쉽지만, 연꽃은 꽃대 쪽의 잎이 갈라지는 반면 순채는 타원형으로 갈라지지 않는 점이 다르다. 천년이 넘는 늪지대에서 자란다고 알려진 순채는 과거 우리나라 전역에서 자생했으나, 현재는 그 서식지를 찾기조차 어려운 멸종위기종이다.
[전남인터넷신문]순채(蓴菜, Brasenia schreberi)는 '순나물', '순(蓴)', '수채(水菜)', '금대(金帶)'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다년생 수생식물이다. 수련과에 속하며, 잎 모양이 어리연꽃과 비슷해 혼동되기 쉽지만, 연꽃은 꽃대 쪽의 잎이 갈라지는 반면 순채는 타원형으로 갈라지지 않는 점이 다르다. 천년이 넘는 늪지대에서 자란다고 알려진 순채는 과거 우리나라 전역에서 자생했으나, 현재는 그 서식지를 찾기조차 어려운 멸종위기종이다.
1997년 동아일보는 “국내 멸종 위기 ‘순채’ 제주 대량 자생 확인”이라는 기사에서 “전남 나주의 일부 연못과 제주 북제주군 빌레못 등지에서 제한적으로 자생한다”고 보도했다. 무분별한 채취와 서식지 파괴로 인해 환경부는 1993년 순채를 특정야생동식물로 지정한 이후, 1998년에는 멸종위기종으로, 2005년에는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Ⅱ급으로 재지정하며 보호에 나섰다.
순채는 귀한 식재료로 오랜 역사를 지닌다. 고대 중국의 《시경(詩經)》에서 ‘순(蓴)’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며, 고려 문인 이규보의 《동국이상국전집(東國李相國集)》에도 기록되어 있다. 조선 실학자 이익(李瀷)은 《성호사설(星湖僿說)》에서 순채 맛보기를 “신선의 취미”라 표현했으며, 《조선왕조실록》 <연산군일기>에는 “순채를 각 도(道)에 진상하도록 했다.”라는 내용이 있다.
또한 《음식디미방》과 《조선무쌍신식요리제법》 등 조리서에서는 순채를 차, 무침, 국, 탕으로 조리하는 방법이 소개되어 있다. 《동의보감》에는 해독과 해열에 효과적인 약재로서의 효능도 기록되어 있다. 허균 역시 《도문대작》에서 “호남에서 나는 것이 가장 좋고, 해서(海西) 것이 그다음”이라며 순채의 명산지를 언급했다.
일본에서도 순채는 귀한 식재료로 여겨졌다. “산에는 송이, 밭에는 인삼, 물에는 순채”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순채에 대한 애호가 깊었다. 메이지 이전부터 일본에서는 순채를 꿀이나 식초를 넣어 음료처럼 마시거나, 튀김, 무침, 절임 등 다양한 요리에 이용하는 식문화가 존재했다.
일제 강점기에는 일본 상인들이 조선의 순채 산지를 수소문하며 무분별하게 채취해갔다. 1930년 잡지 '조선(朝鮮)' 7월호에는 전북 김제의 순채가 특산품으로 소개되었고, 1933년 《조선의 특산(朝鮮の特産)》에서는 김제 공덕면 일대가 순채 주산지로 기록되었다. 당시 순채를 정제하여 병조림으로 가공한 후 일본으로 대량 수출했으며, 김제에서 출하된 184톤 중 80%가 오사카, 나고야, 시모노세키, 요코하마 등지로 배송되었다고 전한다.
일본이 김제의 순채를 대량 수입하던 시기, 나주 역시 순채 채취와 식용문화가 활발했다. 1970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대일 수출이 재개되면서 순채는 중요한 수출 상품으로 자리 잡았다. 나주산 순채 역시 일본으로 수출되었으며, 나주시 공산면 중포리에는 크고 작은 방죽이 있었고, 이 중 작은 방죽은 197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일본 수출용 순채 채취지로 이용되었다.
이곳에서는 함석으로 만든 작은 배 20여 대를 띄우고, 채취자들이 배 위에서 직접 순채를 채집했다. 작업자들은 점심시간도 아껴가며 배 위에서 도시락을 먹고, 순채의 또르르 말린 어린 순을 정성스럽게 땄다. 당시 순채 채취는 수익성이 높아 타지 마을에서도 인부들이 모여들 정도였다. 나주 사람들에게 순채는 귀한 수출 자원이었을 뿐 아니라, 살짝 데쳐 초무침을 해 먹거나 술안주로도 즐기던 소중한 식재료였다.
오늘날 나주에서 순채가 자라는 방죽은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으나 순채 채취와 식용문화는 여전히 어르신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다. 순채가 재배되고 복원된다면 나주의 전통 식재료로 다시 자리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 나주의 순채는 단순한 식물이 아니라, 역사와 문화, 사람들의 삶을 품은 귀한 자원이다. 이를 보전하고 상품화하는 일은 나주 지역 자원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 TA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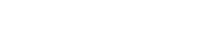


 정읍보호관찰소, 정읍지청장 및 검사, 신규 수사관 등 초청 보호관찰제도 등 업무설명회 개최
정읍보호관찰소, 정읍지청장 및 검사, 신규 수사관 등 초청 보호관찰제도 등 업무설명회 개최
 법무부 남원보호관찰소협의회,‘범죄예방 캠페인’가져
법무부 남원보호관찰소협의회,‘범죄예방 캠페인’가져
 법무부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 비행예방교육강사 간담회 개최
법무부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 비행예방교육강사 간담회 개최
 전주덕진아동보호전문기관·예수병원 유지재단-국제로타리 3670지구
전주덕진아동보호전문기관·예수병원 유지재단-국제로타리 3670지구
 전주완산아동보호전문기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기획과 업무협약 체결
전주완산아동보호전문기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기획과 업무협약 체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