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룡 jnnews.co.kr@hanmail.net
 [전남인터넷신문]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월 2일을 “광복절”이라 부르고, 그날 전 세계 무역 상대국에 “상호 관세(Reciprocal tariff)”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상호 관세가 발표되기 이틀 전, 미국 무역대표부(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USTR)는 “2025년 국가별 무역 장벽 보고서(2025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를 발표했다.
[전남인터넷신문]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월 2일을 “광복절”이라 부르고, 그날 전 세계 무역 상대국에 “상호 관세(Reciprocal tariff)”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상호 관세가 발표되기 이틀 전, 미국 무역대표부(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USTR)는 “2025년 국가별 무역 장벽 보고서(2025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를 발표했다.
USTR은 이 보고서의 결과가 트럼프의 “미국 우선”과 “2025 무역 정책 의제(President’s 2025 Trade Policy Agenda)”를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4월 2일에 "상호 관세"를 발표한 이후, 매우 짧은 기간 내에 세계 경제와 산업 공급망에 충격을 주었다. 세계 각국도 “상호 관세”의 계산 방식과 영향에 주목하고,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다.
최근 각국 정부의 반응을 살펴보면 그 대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 보복 조치를 제안할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다. 둘째, 중국, 유럽연합, 캐나다 등 미국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셋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국내 산업과 노동력에 대한 보조금 지급에 의해 자국 기업의 영향을 줄이는 것이다.
국가마다 "상호 관세”에 다르게 반응하는데, 이는 주로 세 가지 요인과 관련이 있다. 첫째, 해당 국가의 미국 무역 의존도이다. 둘째, 국가의 경제 규모, 특히 국가의 총 국내 소비량이다. 셋째, 국가의 산업 구조와 관련이 있다. 이 세 가지 요인은 앞으로 1~2개월 동안 트럼프와 그에 따른 관세에 대한 각국의 반응 차이를 설명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4월 2일 관세율과 “상호 관세”를 명확히 이해하고 대응하려면 USTR의 “2025년 국가별 무역 평가 보고서”를 해석하고 “2025년 무역 정책 의제”를 살펴보는 것이 좋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을 명확히 하고, 향후 추세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무역 정책 의제 2025”를 재해석해 보면, 미국의 “상호 관세” 정책은 실제로 두 가지 근본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는 다른 방식으로 국제 투자를 미국 국내 생산으로 유치하는 것이다. 둘째는 미국 상품의 수출을 강화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미국 상품”은 특히 미국 농산물을 말한다. 이는 또한 “상호 관세”가 다른 국가들이 양자 무역 협상을 시작하도록 하는 수단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상호 관세 발표 후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 USTR이 발간하는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를 세율 책정의 근거로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 올해 NTE 보고서의 한국 관련 항목에서는 2012년 한미 FTA 체결 후 10년에 걸쳐 대부분 상품에서 관세가 사라졌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농업 부문에서는 월령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한국의 수입 제한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있다. 특히 한국의 두 주요 수출 대상국인 미국과 중국이 관세 갈등에 휘말려 한국 무역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것과 함께 미국 농산물의 대표적인 수입국인 중국이 미국 농산물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농산물 수입에 대한 압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수출금액이 많은 다른 산업의 수출을 위해 미국 농산물의 수입 장벽을 낮춰 수입에 좋은 환경이 조성될 우려도 있다.
미국의 상호 관세와 관련해서 우리 농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단순히 '수출'이나 수출에 필요한 자본을 갖춘 농업 생산자만이 아니라, 주로 국내 판매에 의존하는 소규모 농업 생산자일 수도 있다. 두 나라가 새로운 양자 무역 협상에 돌입함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는 다양한 부문과 피해 정도 사이에서 어떻게 선택할지에 따라 우리 농업이 직면해야 할 큰 과제가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미국의 상호 관세 정책이 우리나라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때 생각해야 할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와 미국이 새로운 양자 무역 협상에 재진입할 때, 산출량 가치, 고용 인구 및 기타 양적 산업 가치가 다른 산업 및 기술 제조 산업에 비해 낮은 농업 분야가 불가피하게 협상의 초점이 될 수 있다.
수출 규모가 큰 부문의 이익을 위해 농업은 희생하고, 그 피해는 보조금 등에 의한 상쇄하면 된다는 논리와 대응을 펼칠 수 있다. 그런데 농업은 식량 안보 차원에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미국과 중국 간의 지정학적 영향이 심화되고 기후 변화가 세계 농업 생산 및 가격 변동에 심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업을 포기했다가 비상 상황이 되면 농업은 단기간에 농업 생산으로 복귀하기 어려운 특성(예를 들어 농지가 다른 용도로 전용되면 농업용으로 복원하기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또한 농업 부문의 소득이 감소하면 농업참여자나 영농 후계자가 급속하게 줄어들고, 농업 생산에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농업을 다양한 시나리오에 놓고 다양한 “영향 시나리오”를 재평가하여 우리나라 농업에 미칠 수 있는 장기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영향을 파악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농산물의 일정 수준의 자급률 확보, 최소 영농 종사자 수 등은 핵심 단어이며, 양자 무역 협상에서 가장 고려되어야 할 내용이다.
[인용 자료]
施柏榮/農業作為關鍵字:川普「對等關稅」對於台灣農業的衝擊(https://e-info.org.tw/node/241055).
- TA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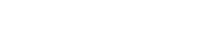


 전주완산아동보호전문기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기획과 업무협약 체결
전주완산아동보호전문기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기획과 업무협약 체결
 전주 스노우의원 피부과, 호성보육원에 300만원 기부
전주 스노우의원 피부과, 호성보육원에 300만원 기부
 법무부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Dream Road’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법무부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Dream Road’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굿네이버스 전북전주1지부, 좋은이웃후원회 2025년 제1차 정기회의 진행
굿네이버스 전북전주1지부, 좋은이웃후원회 2025년 제1차 정기회의 진행
 법무부 남원보호관찰소협의회 회장 이․취임 행사 개최
법무부 남원보호관찰소협의회 회장 이․취임 행사 개최







